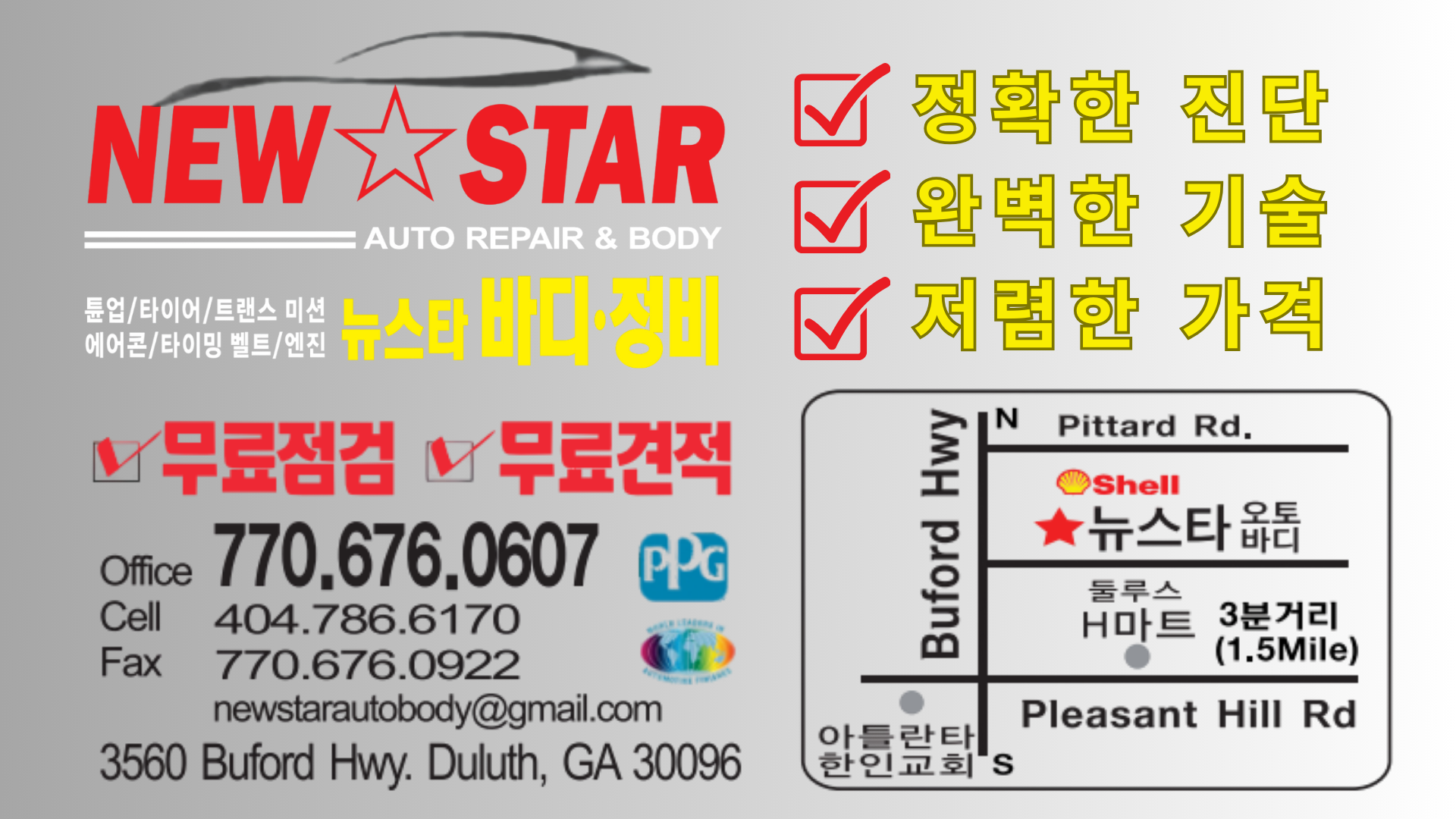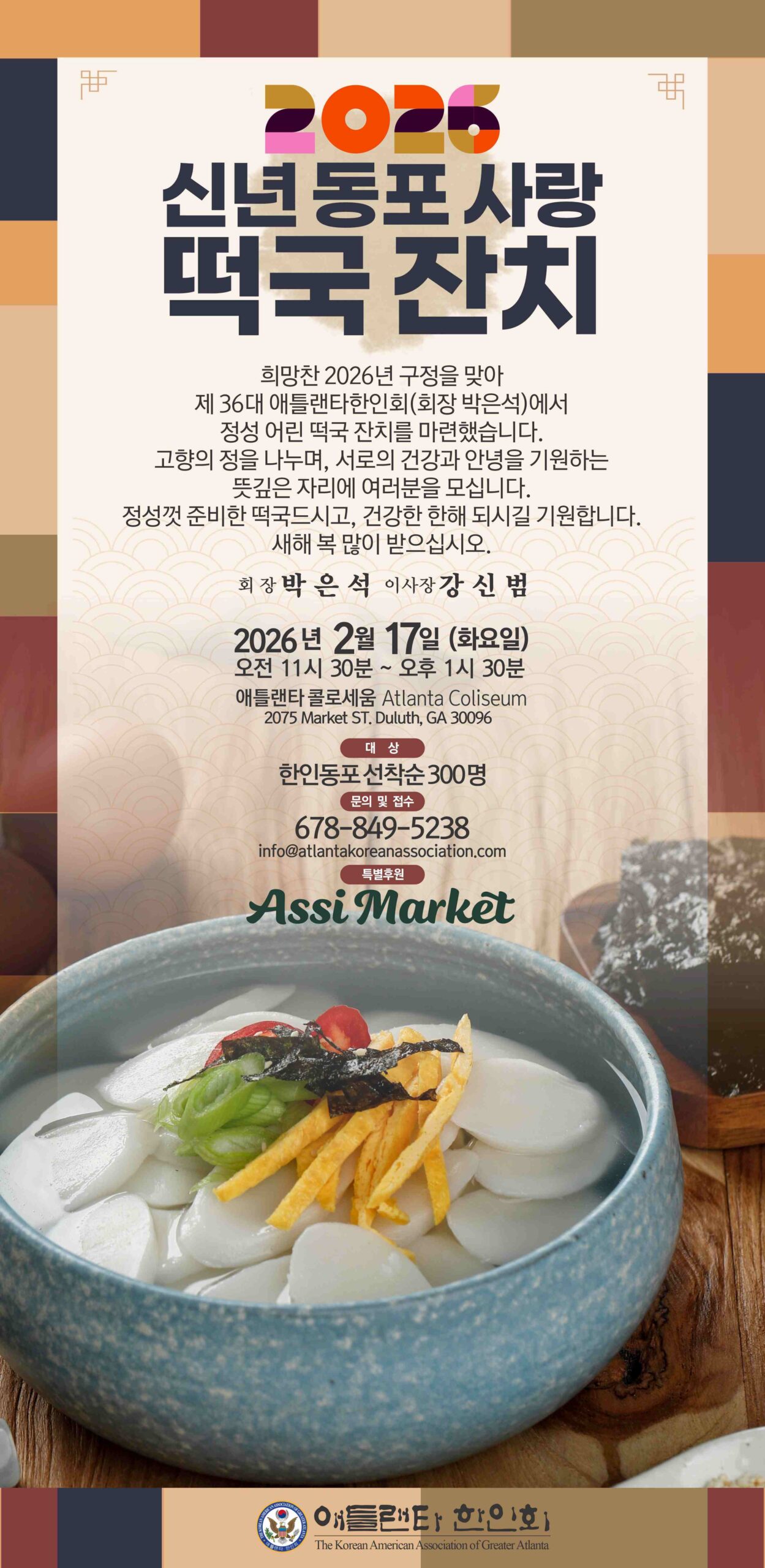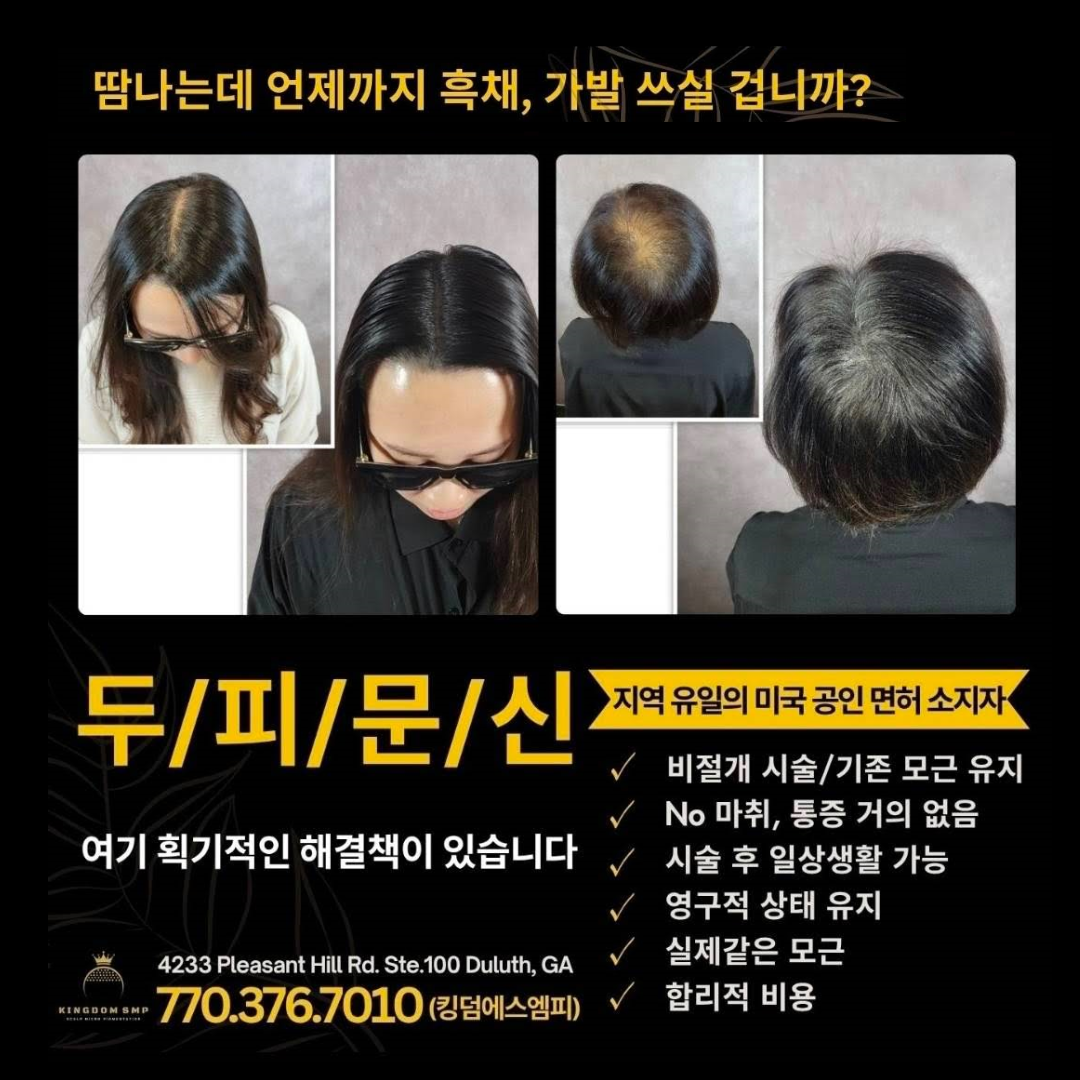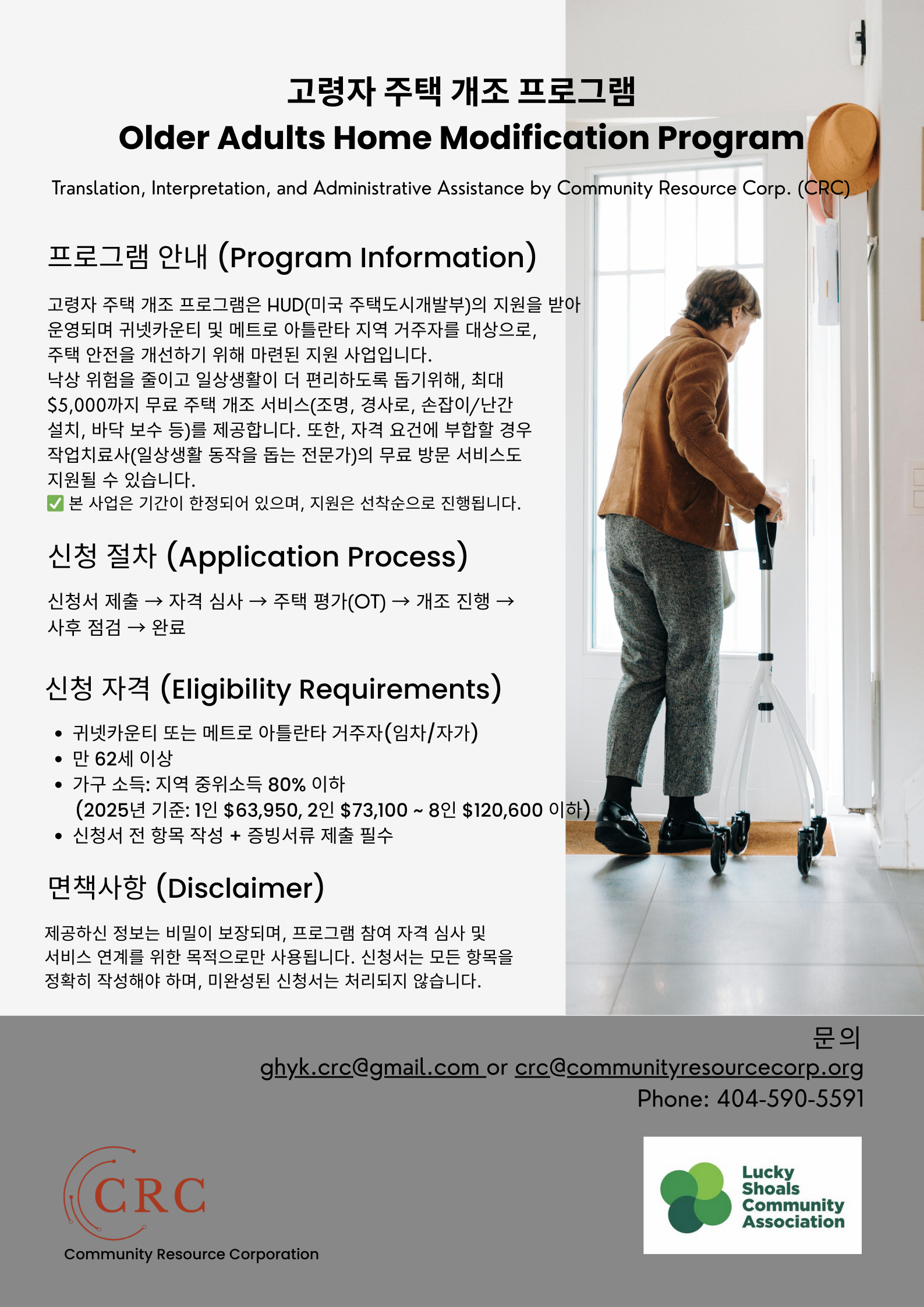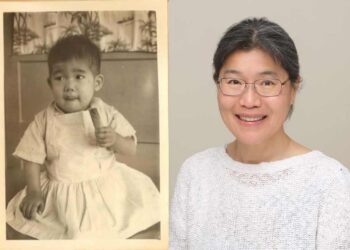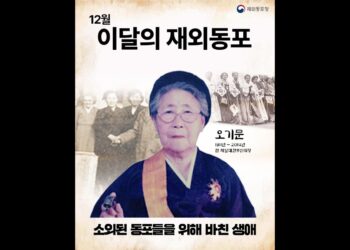힐마 아프 클린트’의 한 장면[마노엔터테인먼트 제공]
독특한 색채·기하학적 형상의 작품 세계와 생애 조명
추상화의 시조로는 러시아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1866∼1944)가 꼽힌다. 동시대에 활동한 스웨덴 화가 힐마 아프 클린트(1862∼1944)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신이 죽고 나서 20년이 지날 때까지 작품을 공개하지 말라고 한 그의 유언 탓이 컸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미술계가 여성인 아프 클린트를 무시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의 추상화는 몇몇 큐레이터 등의 노력으로 뒤늦게 주목받았고, 2018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엔 개관 이후 가장 많은 60만명의 관객이 몰려들었다. 미술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오는 20일 개봉하는 할리나 디르슈카 감독의 ‘힐마 아프 클린트: 미래를 위한 그림’은 아프 클린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칸딘스키의 추상화도 처음엔 미술계의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다는 게 이 관장의 설명이다. 주로 정물화나 인물화를 그렸던 당시 여성 화가에게 추상화는 훨씬 큰 모험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관장은 아프 클린트와 칸딘스키 등이 비슷한 무렵 추상화라는 새로운 예술을 개척한 데 대해 “이들이 함께 겪은 시대 정신이랄까, 그런 부분이 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당시 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붕괴 등을 언급했다.
‘힐마 아프 클린트’는 인간의 본질을 우주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 아프 클린트의 시각을 조명한다.
그도 초기엔 자연주의적 화풍을 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시적인 형상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려고 노력했다. 심령론과 같은 신비주의에 심취하기도 했다.
아프 클린트가 재조명되면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개봉한 ‘보 이즈 어프레이드’의 아리 애스터 감독이 대표적인 예다.
애스터 감독이 연출한 ‘미드소마'(2019)의 배경인 스웨덴의 어느 마을에서 춤추는 주민들이 이루는 동심원은 아프 클린트의 그림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한다.
‘힐마 아프 클린트’는 미술계의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지만, 한국에선 그 이상의 것을 볼 필요도 있다는 게 이 관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가 아는 미술사는 사실 서유럽 중심의 역사다. 추상화의 선구자를 (칸딘스키에서) 아프 클린트로 바꾸자고 하는 건 서구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말이기도 하다”며 “(동양의 미술과 같이) 여기서도 말하지 못하고 배제된 건 뭘까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