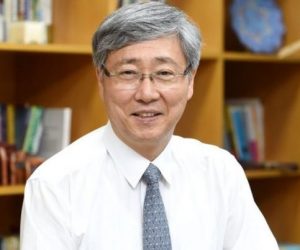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 <시크릿 가든>,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 수많은 명작을 선보인 김은숙 작가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신작, <더 글로리>가 시즌 2를 끝으로 종영하자 당분간 시청할 드라마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 ‘동은’이 가해자인 친구들에게 전하던 주옥같은 대사들이 일종의 밈(재미있는 말과 행동을 온라인상에서 모방하거나 재가공하는 놀이)이 되어 유행하고 있습니다.
“멋지다, 연진아~!” “어떻게 해? 너네 주님 깨빡쳤어. 너 지옥행이래.” “근데 재준아,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하나같이 주옥같은 대사들이 개성 있는 배우들의 정확한 딕션으로 전달될 때, 입 속으로 곰삭이며 따라 하는 익숙한 밈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송혜교(동은 분)의 복수심의 동력이 되는 대사에 주목했습니다. “연진아,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그렇지요! 처음에는 처절한 복수심이란 감정이 시간이 지나며 그리움을 동반한 애증의 관계로 변하는가 봅니다. 누군가에겐 그 피해의 때를 그리워하는 ‘피학적인 콤플렉스’로 남고, 누군가에게는 가해자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장의 동기부여’가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피해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가해자와 동일시하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지나 봅니다. 드라마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 애증의 관계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20세기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여론이 뜨겁습니다. 한편에선 “이제는 일본과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이 군사적 동맹의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기저에 있습니다. 또 한편에선 “역사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화해는 정치적 손짓에 불과하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제3자 변제안’을 대통령 스스로가 들고나온 것이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려가 없는 굴욕적인 야합”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 합방은 합법적이었다.” “강제 동원은 없었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다.”라는 공식적인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입니다.
일제강점기 기간 한국교회는 애국애족의 민족주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교회가 이 시기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애국애족 그 자체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교회의 역사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독일의 국가주의 교회처럼 히틀러를 메시아로 여기며 제국주의와 강자의 관점에서 복음을 해석했던 민족주의 신앙도 존재했고, 한국의 교회처럼 피해자의 관점에서 공동체를 지키려는 노력도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는 개인의 개종을 목표로 한 개인전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하수처럼 흐르는 사회구원을 신앙의 핵심으로 받아들여 왔기에 민족의 독립을 복음적 이상으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으며, 그 가운데 9명이 감리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미래를 보는 ‘창’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특정 시점과 사건을 참조해서 현재에 적용하고,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그의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를 통해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고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일본을 용서한다”라는 선언으로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라는 피해자의 통 큰 결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