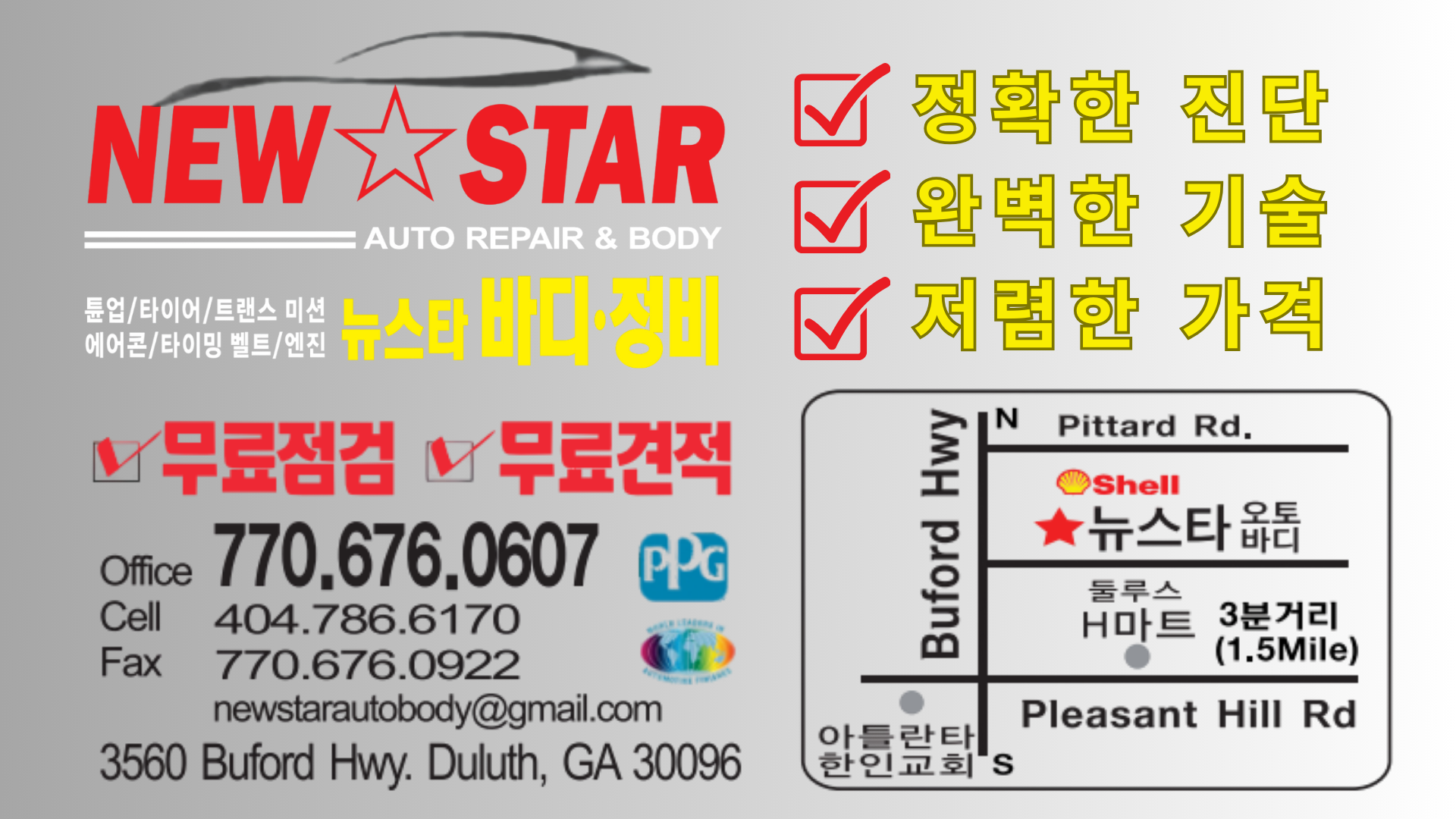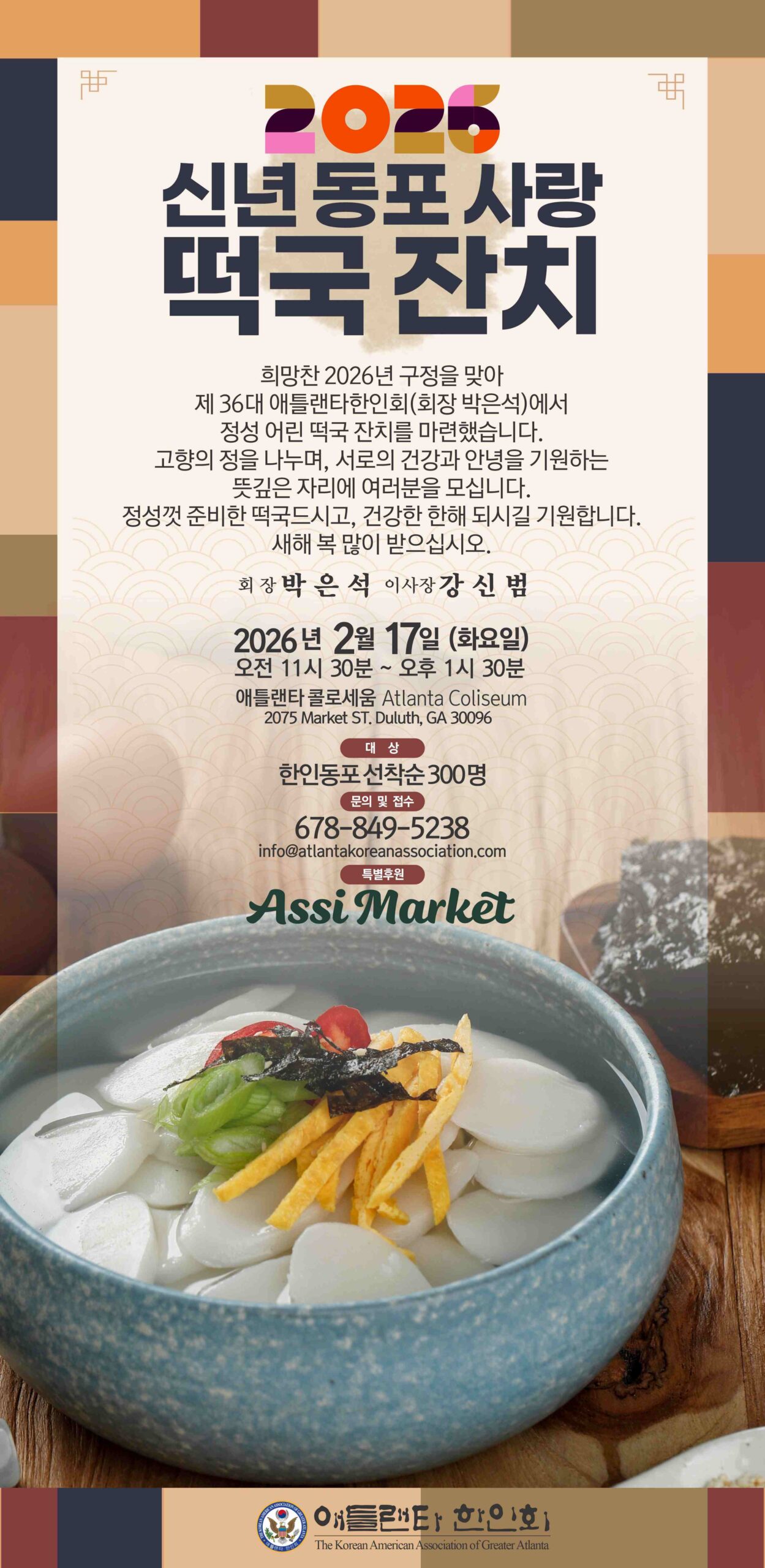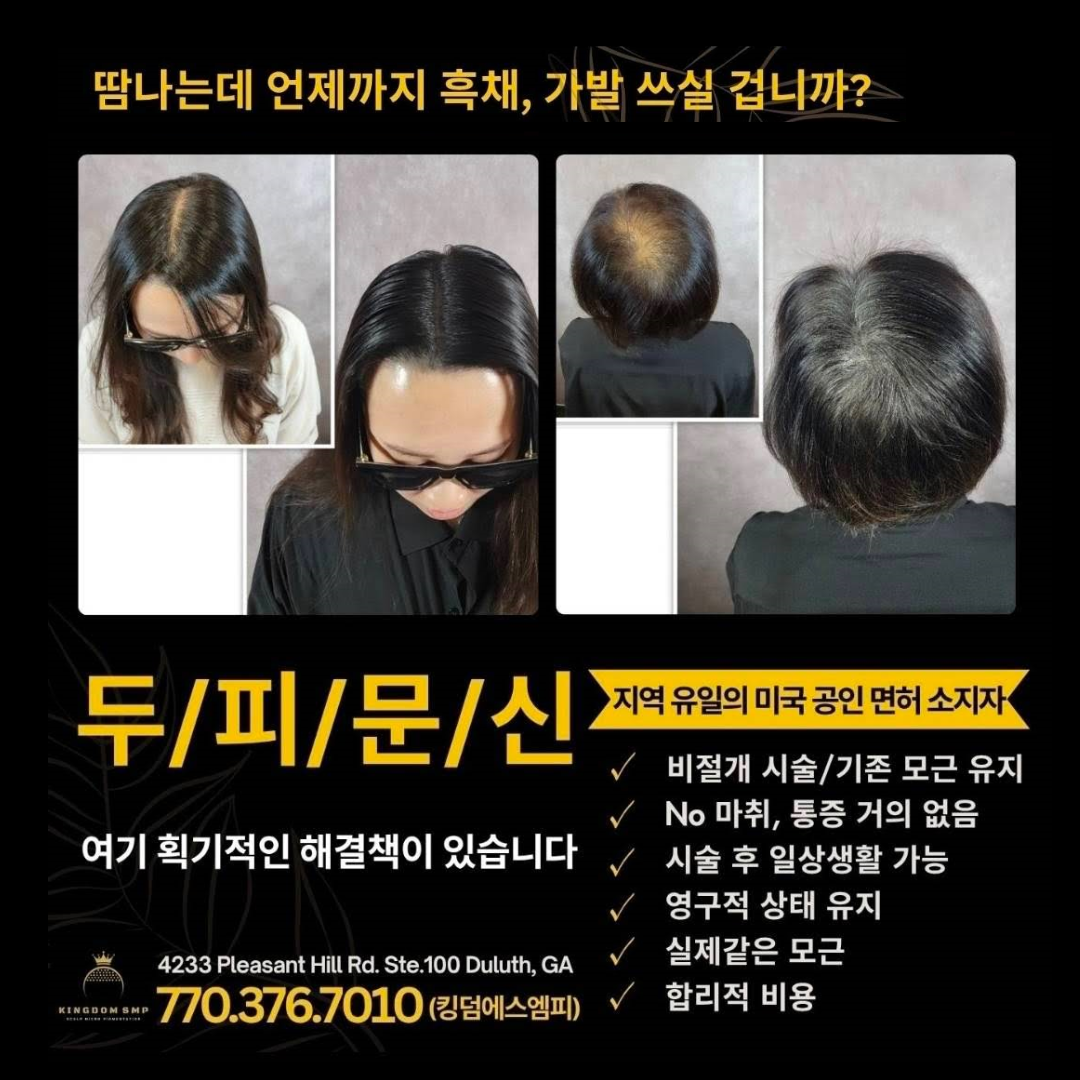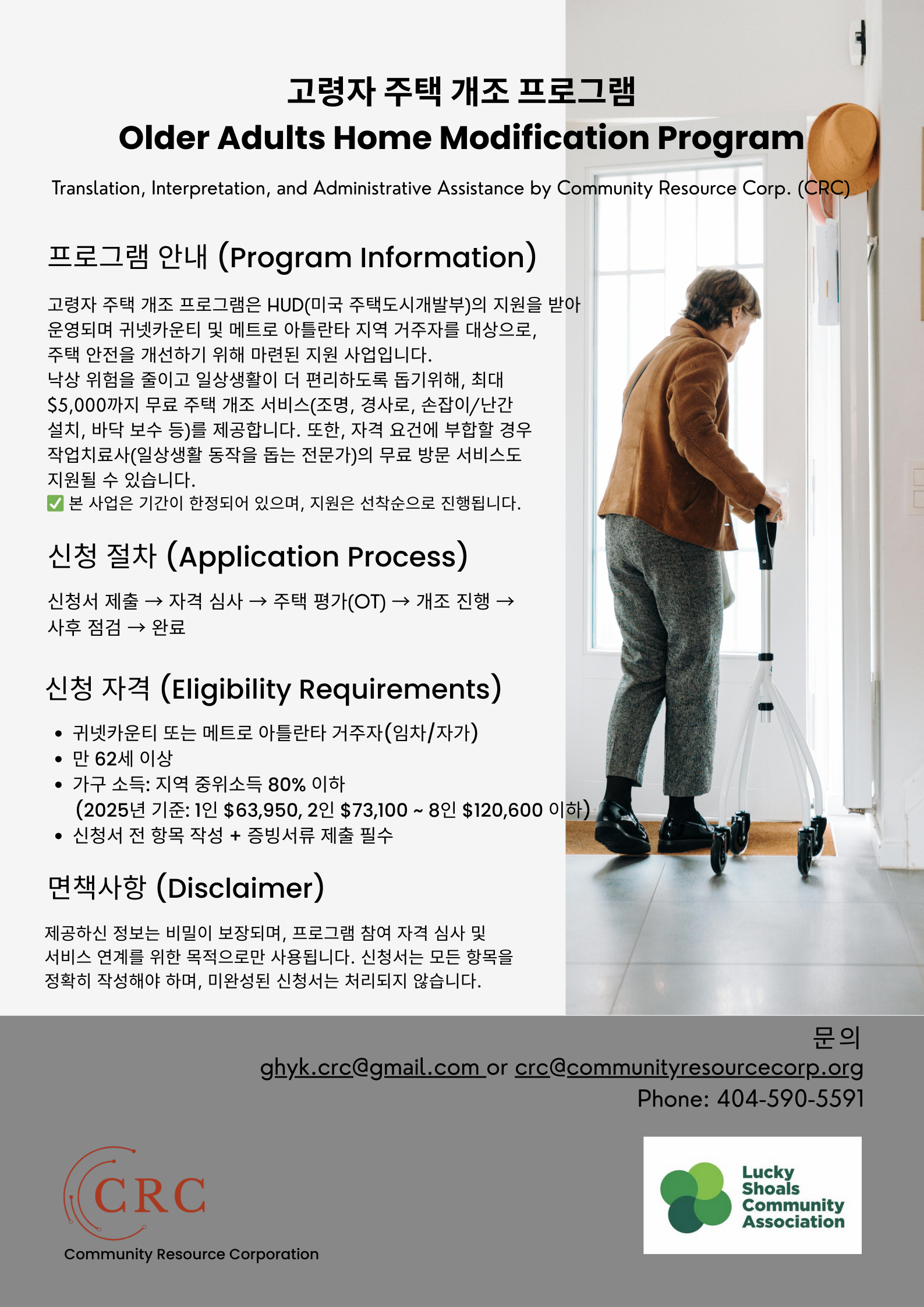고려미술관 전경
故 정조문 선생 수집한 도자·회화 등 1천700여 점 전시
정희두 대표 “일본 속 한국 미술관, 국제인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어머니의 따뜻한 품 같은 곳…한일 젊은 세대 다가서는 공간 되길”
일본 교토(京都) 북쪽의 한 주택가. 교토역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이곳에는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낯익은 돌담과 석인(石人)이 반기는 고려미술관 덕분이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천년 고도’ 교토에서 고려청자와 분청사기, 조선백자, 회화, 공예품 등 우리 문화유산을 모으고 수집해 온 특별한 공간이다.
지난 15일 만난 정희두 공익재단법인 고려미술관 대표이사는 “일본 안에서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다루는 공간”이라며 “어머니의 따뜻한 품 같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고려미술관은 재일 교포 1세 기업인 고(故) 정조문(1918∼1989) 선생이 수집한 문화유산 1천700여 점을 바탕으로 세운 사립 미술관이다.
경북 예천이 고향인 그는 1955년 교토의 고미술품 가게에서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와 마주한 것을 계기로 일본 각지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1969년 조선문화사를 세워 계간지 ‘일본 속의 조선문화’를 50호까지 발간했고, 자신이 살던 집과 고미술품을 기부해 1988년 미술관을 설립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공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우리 문화유산만을 전시하는 유일한 해외 미술관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한다.
정조문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장남인 정희두 대표가 미술관과 연구소(고려미술관 연구소) 운영을 이끌며 매년 2∼3차례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고려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역사이자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문화를 상징하는 교토라는 도시에 우리 문화유산을 다루는 미술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서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이라고 설명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일본 안에 다른 문화, 민족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진정한 국제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한 걸음이라 하셨습니다.”
미술관 곳곳에는 정성 어린 마음이 묻어난다.
1층 전시실에는 화려한 색실로 수놓은 자수 병풍을 비롯해 청자, 나전, 화각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다.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통신사 관련 그림과 자료도 볼 수 있다.
2층은 백자 항아리를 품에 든 정조문 선생의 옛 사진과 함께 과거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공간을 꾸몄다. 정원에 있는 석탑과 다양한 석물, 발코니의 옹기 등 모두 손때 묻은 것이다.
정 대표는 가장 애착이 있는 유물로 백자 항아리를 꼽았다.
1955년 부친이 처음 구매한 항아리는 당시 돈으로 거금인 50만엔. 일 년에 걸쳐 갚기로 약속하고 품에 안은 항아리가 정조문 선생은 물론, 가족의 삶도 바꿨다고 한다.
정 대표는 “볼 때마다 빠져들게 되는 특별한 백자 항아리”라고 했다.
“1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시기인데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순간, 그 힘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정 대표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 싫다고 떨어지거나 문화·역사를 딱 잘라 나눌 수 없는 사이”라며 “일본 안에 우리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를 위한) 큰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잇는 지식인의 부재를 안타까워했다.
정조문 선생은 ‘일본 속의 조선문화’를 발간할 당시 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郞) 등과 교류했고, 1970년대에는 일본 내 한국 관련 유적을 돌아보는 모임을 꾸리기도 했다.
정 대표는 “(재일교포) 1세대와 더불어 이들과 가까운 일본 지식인들도 세상을 떠났다. 문화, 역사 다양한 분야에서 세대를 걸쳐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한발 다가서는 공간으로 미술관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어느덧 개관 37년, 그러나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않은 편이다.
고려미술관 누리집에 공개된 공익재단법인 재무상태표(2024년 3월 작성)를 보면 2023년도 기준 순 재산은 약 4억5천141만엔(한화 약 43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2년의 약 4억5천827만엔(한화 약 44억원)보다 약 7천만원 줄어든 수치다.
1천700여 점에 달하는 유물을 보관·관리하려면 비용이 상당한 게 사실이다. 미술관 운영에 힘을 보태는 일본 내 후원 회원이 200명 정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
정 대표는 “미술관 개관 이래 37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유지·보수할 부분도 많고 보존 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문화유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 방식을 살려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려면 유물 구입비의 10배 정도는 (돈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운영할지가 늘 고민”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도 ‘일본 속 한국’을 지키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 대표는 ‘뿌리’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혹은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든 누구나 그 의미를 기억했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그는 미술관을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 공간”이라고 말하며 “우리 민족이, 우리 핏줄이 왜 일본에 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