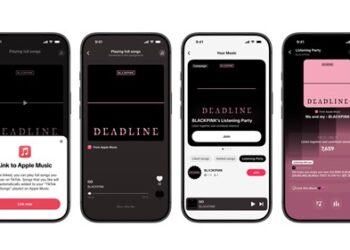쇼팽의 ‘잃어버린 왈츠’ 악보[출처: 모건 라이브러리 앤드 뮤지엄 홈페이지]
NYT “종이·잉크 재질 분석 결과 20대 초반에 쓴 작품 확실”
피아니스트 랑랑 “폴란드 시골의 엄혹한 겨울 연상”
폴란드 출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프레데리크 쇼팽(1810∼1849)이 20대 초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왈츠가 약 200년 만에 미국 뉴욕 박물관에서 발견돼 클래식 음악계가 떠들썩하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7일 홈페이지 기사로 이 곡을 발견한 경위를 소개하면서 톱스타 피아니스트 랑랑이 이 곡을 연주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지면 기사로는 29일자 문화섹션 톱으로 실었다.
NYT에 따르면 올해 늦봄 어느날 낮에 뉴욕 맨해튼 소재 박물관 ‘모건 라이브러리 앤드 뮤지엄’에서 음악담당 학예사로 일하는 작곡가 로빈슨 매클렐런은 수장고에서 최근에 입수된 소장품을 분류하고 있었다.
피카소의 서명이 담긴 엽서, 한 프랑스 여배우의 오래된 사진, 브람스와 차이콥스키가 쓴 편지 등을 넘겨보던 매클렐런은 ‘아이템 147호’를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눌린 자국이 곳곳에 있는 가로 13cm, 세로 10cm 정도인 이른바 ‘인덱스 카드’ 크기의 악보였다. 악보 한가운데 맨 위에는 ‘Chopin’이라는 이름이, 왼쪽 상단에는 ‘Valse'(프랑스어로 ‘왈츠’)라고 필기체로 적혀 있었다.
글씨뿐만 아니라 조그맣고 깔끔하게 적힌 악보의 음표, 그리고 독특한 낮은음자리표 모양까지, 널리 알려진 쇼팽의 필적과 닮아 있었다.
작곡가인 매클렐런은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쇼팽 작품 중에는 이런 곡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정체불명 악보의 사진을 찍어서 쇼팽 연구의 권위자인 제프리 칼버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에게 보냈다. 칼버그 교수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하며 처음 보는 곡이라고 말했다.
이후 모건 박물관 측은 이 악보의 종이와 잉크 재질, 필적, 작곡 양식 등에 대한 감정을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뢰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쇼팽 작품의 자필악보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쇼팽 왈츠 중 작곡가가 1849년 폐결핵으로 숨지기 전에 출판된 것은 8곡뿐이다. 널리 알려진 쇼팽 왈츠들엔 1∼20번까지 후대에 붙인 번호가 붙어 있지만, 이 중 소위 ’20번’은 쇼팽 작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소위 ’17번’도 진위에 대한 의심이 있다.
쇼팽 왈츠가 기존에 알려진 18곡 이외에도 10여곡 더 있었던 것이 편지 등 기록상으로는 확실하지만 현재는 악보가 전해지지 않는다.
이번에 발견된 가 단조 왈츠의 작곡 시기는 쇼팽이 20대 초반이던 1830∼1835년으로 추정됐다. 악보가 적힌 종이와 잉크의 재질을 분석한 결과 당시 쇼팽이 쓰던 것과 일치했다.
미완성 작품이 아니라 완성작으로 보이는 이 왈츠는 반복이 있기는 하지만 48마디밖에 안 되며 연주 시간도 약 80초에 불과해, 알려진 다른 쇼팽 왈츠들보다 훨씬 짧다. 곡 앞부분에 ‘포르테'(f·강하게)를 세 번 겹쳐 쓴 ‘포르티시시모'(fff)가 등장하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피아니스트 랑랑은 NYT의 의뢰로 이 왈츠를 맨해튼의 스타인웨이 홀에서 녹음했으며, NYT는 홈페이지에 이 연주 영상을 공개했다.
랑랑은 이 곡의 거친 도입부가 폴란드 시골의 엄혹한 겨울을 떠올리게 한다며 “쇼팽이 쓴 가장 복잡한 곡은 아니지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쇼팽다운 스타일의 곡 중 하나”라고 NYT에 말했다.
쇼팽이 이 왈츠를 쓸 무렵인 1830년 그의 조국 폴란드는 러시아 제국에 맞서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가 그 이듬해에 무참하게 진압당했다. 20대 초 쇼팽의 작품들에는 이때의 비통함과 불안감이 묻어나온다.
그는 봉기가 실패로 끝난 후 평생 폴란드에 돌아가지 못했으나, 자신이 죽으면 시신에서 심장만은 떼어내서 고국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쇼팽은 1849년 39세의 나이로 숨진 후 파리에 묻혔으며, 그의 누나는 유언에 따라 떼어낸 남동생의 심장을 당국의 눈을 피해 그 이듬해에 폴란드로 옮겼다.